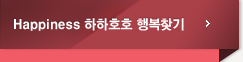인문학 산책
소설과 시를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깃거리로 삼은 적이 언제이던가. 책은 이제 사람들의 손마다 들려진 스마트폰에 영원히 밀려나는 걸까. 허영이든 뭐든 소설과 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하는 것이 편집자들의 바람이다. 그 책이 무엇이든.
글 원미선 문예중앙 편집장
중앙일보 정강현 기자가 최근 시작한 팟캐스트 '소소한 책수다'에서 추천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다. 소위 주체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미국판 강남좌파'의 백인문화를 매우 유머러스하게 비판한 책이다. 그 책의 47번째 챕터는 '인문학 학위'인데, 여기 쓴웃음을 피할 수 없는 지적이 있다. "백인들이 이런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는 파티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좋은 관계도 형성하고, 일자리도 얻고, 부자들도 알게 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헨리 제임스를 읽은 것이 학창시절의 가장 보람 있는 추억입니다'라는 식의 말로 시작된다." 여기, 이 대목, 백인 엘리트들의 스노비즘을 한번 비웃어보자고 쓴 말을 읽으면서 나는 도리어 부러운 마음이 커졌다. 허영이든 뭐든 '소설'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모습 좀 보게 된다면 한이 없겠다는 생각과 함께.
작가의 소울메이트, 편집자
그러고 보니 문학서 만드는 일을 17년째 하고 있다. '무슨 일 하세요'라는 질문에 출판사에 다니며 '책 만드는 일을 한다'고 대답하면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김없이 받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책을 만든다는 건 무슨 일을 말하는 건가요'이다. 글은 작가가 쓰는 것이니까 글을 쓴다는 말은 아닐 테고, 그럼 책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일이나 인쇄 감독 같은 일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출판사에는 물론 북디자이너도 있고, 인쇄와 제책 담당자도 있고, 책을 내다 팔 서점들을 관리하는 마케터들도 있다. 그리고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눈에 띄지 않는 일들만 거의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편집자'라고 불린다.
나는 그 편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도 수많은 편집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책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맞는 작가를 찾고, 집필이 끝나면 그 원고를 교정하고, 책이 완성되면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면,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볼 때 헤밍웨이가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원고를 들고 가서 읽어달라고 조르던 장면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중증 정서불안 환자 같던 헤밍웨이를 안심시키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던 스타인의 모습은 편집자의 한 원형이다. 카프카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던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원고들을 끝까지 지켜낸 이야기는 편집자란 무엇인지를 말할 때 아직도 빠짐없이 거론된다.
편집자는 작가의 소울메이트이다. 때로는 작가 자신보다 그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 작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의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모두 함께한다.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작가를 위해서라면 편집자는 노예도 될 수 있고, 투사도 될 수 있다. 소설이나 시를 꾸준히 읽는 독자들도 으레 책은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틀렸다. 책은 만들어 팔려는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 '상품'이 된 지 오래다.